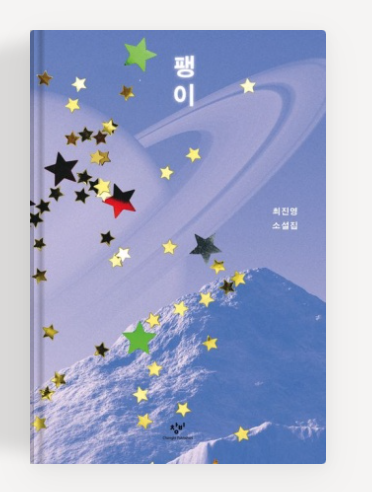
『팽이』는 최진영 작가 특유의 섬세하고도 절제된 문체로, 상실과 성장, 그리고 삶의 균형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제목 ‘팽이’는 주인공이 겪는 삶의 순환, 끊임없는 회전과 멈춤의 은유로 기능하며, 무엇보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 돌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의 감정을 깊이 울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아이와 그런 아이를 품은 어른의 관계, 그리고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려집니다.
1. 줄거리 – 부서진 삶 위에 피어난 관계
이야기는 도시 외곽, 오래된 다세대 주택 ‘봄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여섯 살 무렵,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한 채 방치되며 살아가던 한 아이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한 여성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선’. 선은 정해진 직업이 없는 채 프리랜서로 살아가며,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가 아이를 맡게 되면서, 소설은 두 사람의 조심스럽고도 따뜻한 동거를 그려나갑니다.
처음엔 아이의 이름조차 모르는 선은, 그를 ‘팽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팽이를 돌리다가 넘어진 순간을 본 것이 계기였습니다. “너는 멈추면 쓰러지니까 계속 도는 거구나.” 선의 이 말은 작품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됩니다.
팽이는 말이 없고 감정 표현이 서툽니다. 그는 학교에서도 소외되고,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지만, 선과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변화해갑니다. 선은 그에게 ‘나’를 지킬 수 있는 말과 감정의 표현을 가르쳐주며, 자신도 그를 통해 내면의 공허함을 메워갑니다. 선 또한 자신의 어린 시절, 어머니의 폭력, 방임의 기억을 끌어안고 사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팽이에게 돌봄을 주면서 오히려 자신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둘의 조용한 일상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선, 행정적 절차, 그리고 선의 불안정한 생활 기반은 두 사람을 계속 흔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은 팽이와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팽이 또한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삶’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결국, 선은 팽이의 보호자가 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으며, 이 둘은 '가족'이라는 이름 없는 관계를 현실 속에 세워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돌봄이란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됩니다.
2. 등장인물 – 흔들리는 삶을 지탱하는 존재들
-.팽이 (본명 없음)
6살 무렵 보호기관의 도움으로 선의 집에 오게 된 아이. 말수가 거의 없고, 감정 표현이 희박하며, 초기에는 눈을 제대로 맞추지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선과 함께하는 생활을 통해 점차 말문을 열고, 자아를 확립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름이 없는 존재라는 설정은 ‘존재의 가시성’에 대한 상징으로 읽힙니다.
-.선
프리랜서로 일하며 조용한 삶을 살던 여성.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하지만, 팽이에게 진심을 다해 돌봄을 주는 인물입니다. 과거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와 방임의 기억이 있으며, 그 아픔이 팽이를 이해하고 품게 된 배경이 됩니다. 자신의 삶을 꾸리는 동시에, 아이의 삶도 다시 세워나가는 복합적 존재.
-.정 과장 (사회복지사)
팽이를 처음으로 선에게 맡긴 인물. 국가 시스템의 테두리 안에서 일하지만, 행정 너머의 인간적 이해를 갖춘 사람입니다. 선과 팽이를 둘러싼 제도적 문제들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며, 두 사람의 삶을 지켜보는 제3자이자 감정적 조력자입니다.
-.이웃 인물들 (이웃 아주머니, 어린이집 교사 등)
팽이와 선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의 일상적 충돌은, 한국 사회가 가족 밖의 가족을 얼마나 낯설게 보는지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어떤 시선에서는 방관자이고, 또 어떤 순간엔 삶의 조력자가 되기도 합니다.
3. 배경 – ‘봄 아파트’, 일상이 되는 새로운 세계
소설의 주 배경은 ‘봄 아파트’라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름과는 다르게, 삭막하고 낡은 공간이며,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이들이 모여 사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공간에서 ‘돌봄’과 ‘사랑’이 자라납니다.
팽이가 머물던 이전의 가정은 철저한 무관심과 방임의 공간이었습니다. 방 한 켠에 아이를 내버려둔 부모, 아이가 굶어도 모른 척하는 어른들. 반면 선의 집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말과 적절한 거리, 감정의 교류가 있는 공간입니다.
공간의 묘사는 삶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어질러진 방, 함께 정리하는 부엌, 씻겨주는 욕실의 장면 등은 단지 환경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 간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서사의 장치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4. 도서평 – 팽이처럼 흔들려도, 함께라면 멈추지 않는다
『팽이』는 단지 한 아이의 성장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며, ‘가족이란 무엇인가’, ‘돌봄이란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진영 작가의 글쓰기는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절제된 문장과 세심한 시선으로, 글을 접하는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감정을 끌어올리게 합니다. 이는 곧, 팽이라는 인물의 서사 방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이는 쉽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말 없는 행동 속에서 무수한 감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린 이유는, 이 이야기 속에 ‘나의 어릴 적’, ‘나의 아픔’, 혹은 ‘내가 누군가를 품었던 기억’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그 보편적인 정서를 매우 정교하게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비평가들 역시 『팽이』를 두고 “현대 사회의 돌봄 공백을 치열하게 마주한 소설”, “비혈연 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탐색”이라고 평가하며, 기존의 성장소설, 가족소설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로 주목했습니다.
『팽이』는 아이가 중심에 있지만, 아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도 흔들리는 우리는 모두 ‘팽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지 않으면 쓰러지고, 멈추면 상처받는 존재들. 하지만 그 곁에 함께 도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회전은 고통이 아니라 생존이 되고, 의미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최진영 작가는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도 조용하고 아름답게 들려줍니다. 『팽이』는 삶에 대해, 관계에 대해, 그리고 인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특별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어가는 시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초엽작가의 『지구 끝의 온실』:줄거리, 등장인물, 배경, 도서평, 결론 (0) | 2025.07.05 |
|---|---|
| 김해솔의 『노간주나무』:줄거리, 등장인물, 배경, 도서평, 결론 (0) | 2025.07.04 |
| 백사혜의 『그들이 보지 못할 밤은 아름다워』:줄거리, 등장인물, 배경, 도서평 (0) | 2025.07.02 |
| 미야베 미유키의 『귀신저택』:줄거리, 등장인물, 배경, 도서평 (0) | 2025.07.01 |
|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깊이에의 강요』: 줄거리,등장인물,배경, 도서평 (0) | 2025.06.30 |



